
세계유산본부는 성산 피난교회가 유적지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럼 그 본부인가 하는 곳에 가보면 되겠네요”
마승용 목사(성산포교회)의 말이 맞았다. 세계유산본부에 가서 담당자의 답변을 듣기 전까진 찜찜할 필요가 없었다. 지레 짐작하지 말아야 한다. 업무 떠넘기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유적지화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 준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세계유산본부에서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경우, 시청에 다시 찾아가면 된다. 몇 번이고 부딪히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 목사는 무슨 일이든 배가 든든해야 한다면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했다. 가는 길에 서귀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차성원 목사가 합류했다. 서귀포에서 최초로 문을 연 중화요리 전문점이라는 설명과 함께 식당에 들어섰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붐비지 않아 곧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창 너머로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렸다. 저 바람이 조금은 시원해 보였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차 목사에게 물었다.
“서귀포교회는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차 목사는 단무지를 집으려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쉬운 목회 현장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소위 ‘꿀 빠는’ 목회 현장을 본 적이 없다. 서귀포교회가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은 한 성도의 헌신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년 안에 새로운 부지에 교회를 지어야 하는 형편이다. 목회 사역의 난이도를 굳이 표현한다면 교회 건축은 아마 최상단에 위치할 것이다. 음식이 차려진 후에도 차 목사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그만큼 간절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방증처럼 들렸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짭조름한 바다 향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서귀포교회가 새로운 부지로 고려하고 있는 땅을 보러 가기로 했다. 서귀포 시내를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어느 갑부의 별장이었다. 최근 소유주가 값을 내려 내놓았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넓은 대지와 건물이었다. 차 목사는 며칠 전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다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 순간 묵직한 망치가 뒤통수를 내려치는 듯했다.

성산 피난교회는 문화재가 될 수 있을까

성산 피난교회는 문화재가 될 수 있을까
차 목사를 서귀포교회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마 목사와 기자는 세계유산본부에 바로 가보기로 했다. 미리 약속을 잡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돌아보면 시청에서도 ‘성산포 피난교회는 유적지로 지정하게 부적합합니다’라든지 ‘관련된 법령을 찾을 수 없습니다’는 등의 부정적인 대답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계유산본부에 가시는 것이 이 일에는 적합합니다’라고 안내를 받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30분쯤 되는 거리였다. 가는 길, 스마트폰으로 세계유산본부를 살펴봤다. 제주 세계유산본부 주최의 제주국제사진공모전 결과 발표 기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스크롤을 내리는 중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으로 선출”됐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세계유산위원국으로 선출됐고, 오는 2027년까지 위원국으로 활동하며 세계유산 등재 심사 및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성산포 피난교회가 심사를 받게 된다면 국제적인 규모로 심사가 이뤄지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주차장에 도착해 잠시 숨을 고르고 기도했다. 마 목사는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듯 서 있는 세 개의 돌하르방을 지나 정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내데스크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인상이었다. 아마도 찾는 이가 적어 텅 비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문화재과를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경비원으로 보이는 이가 “저기 복도를 쭉 따라 들어가면 맨 끝에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라고 안내했다. 다소 어두운 로비와 달리 사무실이 위치한 복도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빛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 다시 한번 노크와 함께 문을 열고 역사문화재과 사무실로 들어섰다.
이야기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성이고 있던 마 목사가 나를 발견하고 물었다.
“본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마치 판박이처럼 오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마 목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함께 차에 올라타며 그에게 되물었다.
“혹시 도 등록문화재라고 아세요?”
* 이 기사는 삼육대학교와 삼육서울병원의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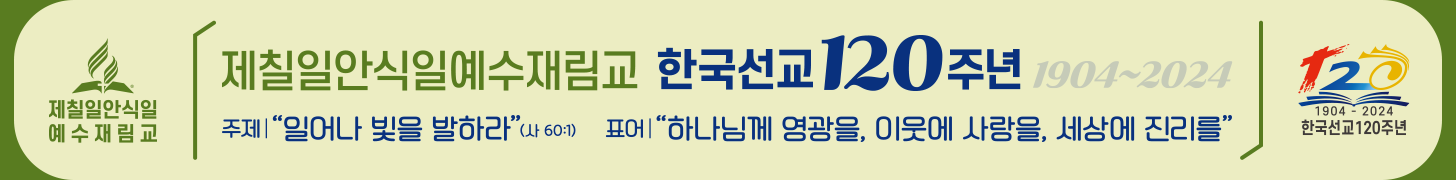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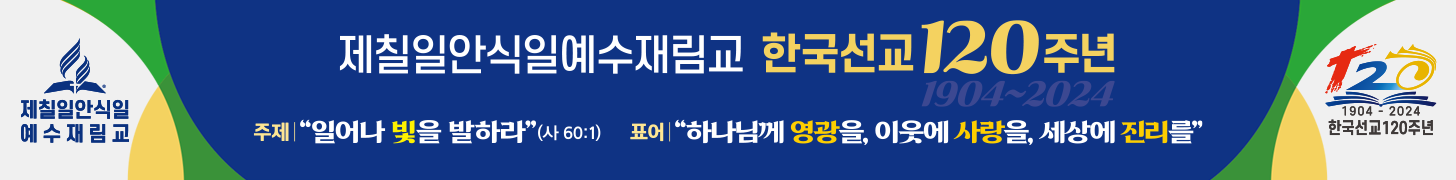


![[종합] 재림신문 읽고 ‘골든벨’ 울려볼까](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4/2890328441_0nyEoGPj_c3ac49a24f46e3bd1b23728a268938009a8bae2d-218x150.jpg)
![[일문일답] 조직체가 다시 비대해지지 않기 위한 예방책은?](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4/2890325903_hdz3mOnB_a364774822fcb13df8c33dd93b22c175bdf9cefd-218x150.jpg)


![[4월 14일 일요일 예수바라기] 잠언 1장 (1) 잠언을 읽으면 우리는 똑똑해질까?](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4/J2024_04_14-218x150.jpg)
![[4월 14일 일요일 장년 교과] 타협: 사탄의 교활한 전략](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4/S2024-04-14-218x150.jpg)
![[4월 14일 일요일 장년 기도력] 객관적인 자세로 직접 성경을 연구하라](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4/A2024-04-14-218x150.jpg)
![[4월 14일 일요일 어린이 기도력] 모하비 사막 이야기(2)–안식일](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4/C2024-04-14-218x1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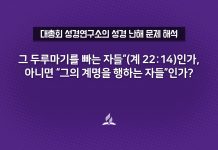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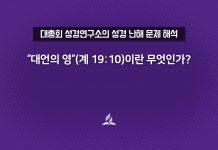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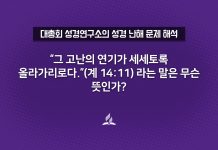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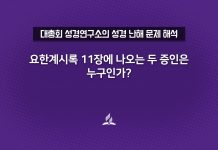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22](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3/01/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4-218x150.jpg)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22](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2/12/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4-218x150.jpg)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21](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2/12/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3-218x150.jpg)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126](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2/12/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0-218x1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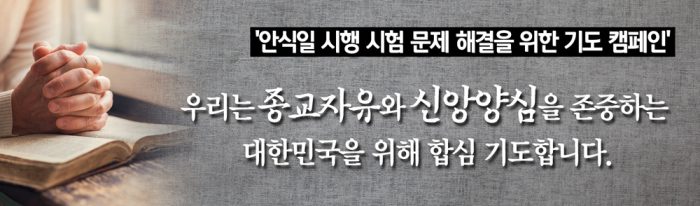
![[일문일답] 조직체가 다시 비대해지지 않기 위한 예방책은?](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4/2890325903_hdz3mOnB_a364774822fcb13df8c33dd93b22c175bdf9cefd-400x400.jpg)

![[종합] 재림신문 읽고 ‘골든벨’ 울려볼까](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4/2890328441_0nyEoGPj_c3ac49a24f46e3bd1b23728a268938009a8bae2d-400x4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