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연 집사는 화마로 소중한 재산을 잃었지만, 시련 중에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 찾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
“연기가 자욱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거대한 불 앞에 두려워 떨고만 있었죠. 소방차로는 도저히 끌 수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 개울가처럼 물이 흘러넘치도록 비가 내렸죠. 정말 억수같이 퍼부었어요”
김소연 집사는 ‘기적 같던’ 당시 상황을 담담하게 떠올렸다. 그는 지난 11일 발생한 강원 강릉시 산불로 3층 규모의 개인 소유 펜션 상당 부분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암담하고 원망스런 상황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찾았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마치 태풍이라도 상륙한 것처럼 맹렬한 강풍을 타고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설상가상 화재진압용 헬기도 뜨지 못했다. 화재현장 멀리서 바라보는 펜션은 유난히 작아 보였고, 엄습하는 화마는 금세 건물을 집어삼킬 듯 거대했다. 소방차가 뿌리는 물줄기는 뜨거운 불길에 금방 기화되는 듯 보였다.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거대한 비구름을 몰고 오셨다. 이내 장대비가 쏟아졌고 불길은 맹위를 잃었다. 비는 20분 동안 부족함 없이 내렸다. 강릉시 전체를 태워버릴 것 같던 산불도 고개를 숙였다.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불길이 잡히고 현장에 접근이 가능해지자 세입자 부부와 현장을 살폈다. 김 집사는 지난해부터 젊은 신혼부부에게 세를 주고 펜션의 운영을 맡겼다. 불이 난 것을 알게 된 것도 부부의 전화 덕분이었다. 함께 화재현장을 정리하는 두 부부의 손이 상처로 가득했다.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다. 전화로는 다친 데도 없고 괜찮다더니 그게 아니었다. 연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두 부부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전화가 와서 몸은 괜찮은지 다친 데는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혹시라도 쓰러질까 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김 집사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찾았다. 당시 늦잠을 자고 있던 펜션의 손님 중 누구도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것이다. 펜션을 운영하는 두 부부가 손님부터 깨워서 대피시킨 까닭이다.
그렇다고 근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화재를 입은 펜션에 대한 후속 조치가 급하다. 만약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정리한다면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철거하지 않고 뼈대만 남기고 개보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동일하다.
더 큰 문제는 세를 내고 펜션을 운영하는 두 부부였다. 그들은 지난해 8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고 올해부터는 여행객이 부쩍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투자했다. 큰돈을 들인 탓에 이들 부부의 수중에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 집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집사도 당장 손을 쓸 방도가 없다. 김 집사와 부부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중복지급이 안 된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그는 “살다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 항상 태풍만 걱정했지, 큰불이 날줄은 전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태풍 ‘루사’(2002)와 ‘매미’(2003)가 이 지역을 훑고 지나가며 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기에 홍수에는 대비했지만, 산불에는 별다른 손을 쓰지 않았다.
아직도 산불 당시를 떠올리면 가슴이 떨리고, 걱정이 밀려온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내어맡기기로 했다. 그분께서 주신 사명 즉, 복음전도에 더 힘을 쏟으려 한다.
“답답하고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복음사업에 매진하면 주님께서도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해결을 위해 섭리하지 않으시겠어요? 거센 불길 속에 폭우를 내리신 것처럼요. 안 그래요?”





![[종합] 재림성도, ‘크리스마스’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려면?](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2/2890360018_Kbev1Naz_816b64c37bc266e57b2562238468af5ebab43b54-218x150.jpg)
![[종합] 화잇 선지자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2/2890328453_vPfbsKRZ_29f6c87951d554492c912ea57f6a1f814400dcfe-218x150.jpg)
![[12월 26일 목요일 예수바라기] 에스겔 46장 예배가 회복된다](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2/J2024_12_26-218x150.jpg)
![[12월 26일 목요일 장년 교과] 예수 안에 거함](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2/S2024-12-26-218x150.jpg)
![[12월 26일 목요일 장년 기도력]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반영해야 한다](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2/A2024-12-26-218x150.jpg)
![[12월 26일 목요일 어린이 기도력] 어떤 상황에서든지!](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2/C2024-12-26-218x1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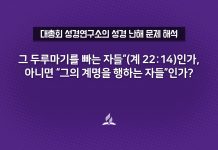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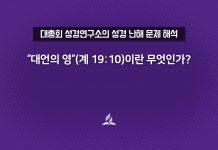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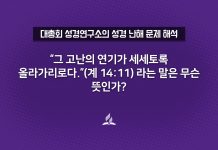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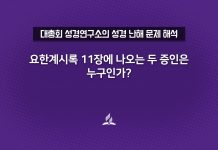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22](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3/01/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4-218x150.jpg)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22](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2/12/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4-218x150.jpg)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21](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2/12/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3-218x150.jpg)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126](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2/12/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0-218x150.jpg)

![[세계선교 신탁] 지경 넓히는 서울영어학원교회](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2/11/News_11517_file1-400x400.jpg)
![[전문] 테드 윌슨 대총회장, ‘코로나 사태’ 특별담화](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0/04/News_9808_file1-400x400.jpg)
![[종합] [광복절 특집] 도산 안창호, 재림교회와의 인연](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3/08/2890328405_kTnEIROg_5c705f7b37158734285613bd14810abb3e114256-400x4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