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상적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활짝 웃으면서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은 언제 보아도 마음이 포근해진다. 그들의 눈에는 애정이 넘치고 미소에는 따스한 마음이 스며 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저절로 완벽한 가정을 연상하면서 우리 집도 애정과 따스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나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 집은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지, 식구들이 서로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말이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우선 ‘가정(家庭)’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한 첫 번째 풀이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고, 두 번째 풀이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이다. 딱히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단어인데, 실생활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적용하려 하면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고민된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산다면 당연히 가족이라고 해야 한다. 삼촌이나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촌, 당숙, 육촌으로 가면 갈수록 가족의 범위 바깥쪽에 가까워진다. 멀리 사는 팔촌이 학교 때문에 우리 집에서 유숙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팔촌은 가족인가 아닌가. 가정의 사전적 정의대로 ‘가까운 혈연관계’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강원도 강릉 위촌리에는 아직도 명절이면 갓과 도포를 차려입고 마을 어른께 절을 하는 풍습이 남아 있다. 내 친구가 마침 그 동네 사람이라서 이따금 그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 준다. 그러면서 사진 속 인물을 소개하는데 내가 들은 가장 먼 촌수는 12촌이었다. 12촌 아저씨라고 하기에 그 정도면 남이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한 집안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등장한다. ‘집안’이다. 집안의 사전적 정의는 ‘가족을 구36 성원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공동체 또는 가까운 일가’이므로 집안과 가정은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이다. 내 친구가 말하는 12촌 아저씨는 같은 집안이며 가족 구성원이 되는 셈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나 가족의 범주가 사람마다 혹은 집안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같은 혈족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의 혈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물론 요즘은 부부와 직계 존·비속 정도를 가정의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추세이기는 하다.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르겠지만 예전과는 달리 5촌 당숙이나 6촌까지만 가도 교류가 없는 집안에서는 남이나 다름없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가정’이라는 단어가 중국 고대 기록이나 조선 시대 문헌에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의미도 같을까? 그렇지 않다. 근대 이후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모범처럼 만들어진다. 나의 어감으로는 가족보다 가정이 조금 큰 범주로 느껴지는데 그것은 근대 이전 문헌에서 가정의 범주가 지금보다 넓었기 때문이다. 요즘의 단어로 치면 가문(家門)과 비슷한 단어가 가정이었다.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가문 혹은 가정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내부에 일정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도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상존한다. 다만 화목한 가정이라면 그 갈등을 구성원의 사랑과 배려, 노력으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말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구성원 간에 암묵적으로 공유하거나 합의하고 있는 규율이라 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상적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구성원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규율이 더욱 잘 만들어져 있어야 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예기(禮記)』뿐 아니라 조선 후기 서당에서 모든 학동이 읽던 『소학(小學)』도 그런 규율을 모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근대 이전의 가정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만들어 갔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논어(論語)』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고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옛 기록이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빛나는 지혜는 지금 우리 문제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풍기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가정과 건강 1월호 제공







![[12월 29일 일요일 예수바라기] 다니엘 1장 (1) 포로](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2/J2024_12_29-218x150.jpg)
![[12월 29일 일요일 장년 교과]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2/S2024-12-29-218x150.jpg)
![[12월 29일 일요일 장년 기도력] 하나님의 율법은 참된 회개로 이끈다](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2/A2024-12-29-218x150.jpg)
![[12월 29일 일요일 어린이 기도력] 진짜 부유한 삶!](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2/C2024-12-29-218x1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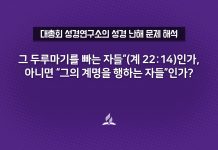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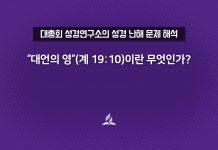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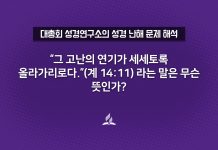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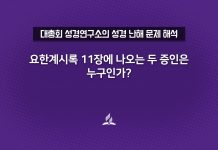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22](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3/01/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4-218x150.jpg)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22](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2/12/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4-218x150.jpg)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21](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2/12/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3-218x150.jpg)
![[캘리그래피] 생애의 빛, 126](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2/12/2022-생애의-빛-캘리그래피-70-218x150.jpg)
![[특별기획] [김지혜의 interview-e]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중곡교회 배찬원 집사](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8/2728294107_8GJDg1sr_55deabe30334a00dd2c1b52e3b4c97d3589e5869-400x400.jpg)
![[종합] 성소수자를 대하는 성경적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자세 (마지막 회)](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2/2890300067_s87bdGtI_8cfd4a17c1cfb88a7f86bf87563881b885e9406b-400x400.jpg)
![[특별기획] [김지혜의 interview-e] 영양사면허 ‘안식일시험’ 청원 김명원 집사](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10/2890167887_INpQRWkK_e2c02f9b728a9c4a681c04ce09ee3db74eb6b238-400x400.jpg)
![[특별기획] [권태건의 내러티브 리포트] ‘호남선교 1번지’ 나주교회(1)](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6/2890325740_Fy2onPNJ_4a1f7b366a434bcb2700383ceebd552e093cb86d-400x400.jpg)
![[사랑의 고리] 김은혜 성도 돕기 성금 전달](https://story.adventist.kr/wp-content/uploads/2024/09/2890325529_PIAESD27_31fd5e4dc53756cf2957cdc820f8aa32c4fff772-400x400.jpg)
